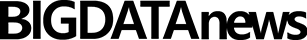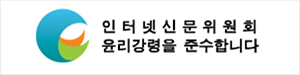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불완전한 설명과 기망행위로 인한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이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 이러한 법 제도 정비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당면한 숙제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자가 소비자 주거지나 직장 등을 방문하거나, 통신 판매 경우를 규율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소비자는 분양 사무소를 방문해 계약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가 매우 모호하다.
분양 사무소를 방문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방문판매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분양받은 소비자가 분양계약 철회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증거 부족 등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증명하기 어렵다.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적용을 원하지만, 실제 해당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소비자는 오로지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면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약철회가 인정될 것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아줌마(호객꾼)가 A씨 매장으로 들어와 부동산 투자 권유를 하며, 견본 주택으로 방문 고객 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아줌마(호객꾼)는 퇴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아줌마(호객꾼)는 날씨도 추우니, 퇴근할 수 있도록 잠깐만 설명을 들어줄 수 없겠냐며 사정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견본 주택에 같이 들어간 후, 분양 상담사의 화술에 현혹돼 분양계약을 진행했다. 법적으로 분명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그러나 A씨는 호객꾼 아줌마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 또한 견본 주택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채용한 호객꾼을 하나 같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했다. 결국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진행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방문판매법 보호를 받기 어렵다.
위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도 방문판매법 피해 사례는 무수히 많다. 현실에서 방문판매법 적용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에 더해 계약자들은 여전히 방문판매법 적용이 쉬운 줄 알고 섣불리 소송했다가 패소한다. 이들은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비싼 선임료 등으로 경제적인 2차 피해를 본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에게 분명히 계약철회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부동산 분양계약에 있어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당시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범한 소비자가 사기 분양 등에 속아 하루아침에 피해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분양계약과 같은 고액 거래에서 방문판매법, 계약철회권에 대한 요건, 기한 등의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절차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임이랑 빅데이터뉴스 기자 lim625@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