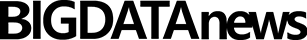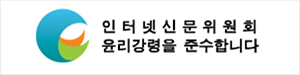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칼럼] ‘알파고 쇼크’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31511423201994392c8a1984218144184218.jpg&nmt=23)
그 돌들의 움직임에 따라 잘하는 이들은 허세를 부리고 그 위에 문화를 입힌다. 명인과 장인을 대접하고 스승으로 섬긴다. 그런 짓을 수천 년 하다 보니 기보가 쌓이고 거기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발견한다. 결국 근대화 이후엔 프로화가 진행되어 몇 억씩 상금을 타가는 전업 기사가 출범한다.
그리고 그랬던 그들은 알파고의 기보에서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느꼈다. 알파고는 인터넷 바둑에서 60전 60승을 했고 그 기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어떤 프로들은 또 알파고의 기보를 쳐다보면서 바둑을 연구했다. 누구는 그래서 기력이 급상승했다. 참으로 인간적인 이야기들이다.
알파고가 커제와 대결할 때엔 이세돌과 둘 때보다 인간적으로 뒀다고 안심을 했는데, 이후 구글 측이 알파고끼리 둔 기보를 공개하니 프로기사들이 경탄을 한다. 이 반상에서 승부를 거두는 법칙을 인간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경탄하게 된 듯하다. 역시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반상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바둑이 제 아무리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 한들 룰이 명확한 게임이다. 가령 현재 반상에 올라온 돌의 형태가 동일하다면,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건 이 다음의 최적의 수는 같다는 식이다. 그러나 세상사는 반상처럼 분절되지 않았기에 다른 여러 변수들이 발생한다.
알파고식으로 하는 계산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이 바둑(그러니까 계산의 영역)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이 판단 자체가 애매하고 직관적이고 인간적이다.
그렇다면 본인의 형편에 맞는(아마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테니) AI 프로그램을 받아든 인간 자신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모두가 AI 집사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모두가 잘 살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모두가 매 인생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원초적으로 말하면 나무막대기를 들었을 때와, 좀 진전하면 계산기를 들었을 때와 비슷하다. 주어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거라는 얘기는 인공지능이 감정적 호오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된 이후의 가능성으로 일단 미뤄도 좋다.
결국 주어진 현실을 언어화한다면 이렇다. 계산으로 정확한 답이 나오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에 대해선 계산을 믿고, 후자에 대해선 보조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후자라도 계산의 도움은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으로 답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워야 할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을 보조하기 위해 계산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조직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가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다가올 세상이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직은 ‘그런 방식’이 정확히 어떤 것이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논의와 제한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언론의 역할은 그러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일 게다.
한윤형 편집인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