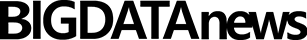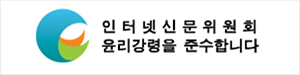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칼럼] 한국에서도 빅데이터가 가능해?](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8031511332603103392c8a1984218144184218.jpg&nmt=23)
빅데이터뉴스에 합류한 입장이니 어깨가 무겁다. 어찌 됐건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며, 닥쳐올 파도와도 같다. ‘빅데이터’나 ‘4차산업혁명’과 같은 말들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들이 없는 것인 양 처신하며 살 수는 없다.
특히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무엇을 바꾸고 어떠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한국 언론이 이 문제에 관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신기사 정도는 로봇이 쓸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건만, 트래픽을 잡아 내기 위해 상당수 기자들이 그 로봇이라도 쓸 수 있는 기사를 생산하는데 노동력을 소모한다.
‘디지털 퍼스트’를 말하기도 하지만 고전적인 편집부와 새로이 인터넷 기사를 생산하는 이들의 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은 그대로 있고 웹뉴스 대응이 추가된 셈이다. 한국의 조직문화에서는 변혁의 파고가 몰아쳐도 그에 맞춰 혁신을 하기 보다는 일단 구성원의 노동시간을 늘려서 대응하게 된다. 언론에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가 많아진 시대에 기자 개개인은 생각할 시간이 줄었다.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SF적 상상력이 아닌 시대에(물론 이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해석 여하에 따라 ‘이미 온 것’과 ‘앞으로도 오기 어려운 것’이 나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등장하기도 전에 ‘고장난 인공지능’처럼 처신하고 있다.
한국 사회엔 데이터만 적은 것이 아니다. 사실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자세도 아쉽다. 여론조사 역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진행된다. 정치권 언저리에서 그것을 분석하는 소위 ‘선수’들은 나라가 넓지 않고 기존의 관성에 대한 분석이 있으니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된다고 믿는다. 그렇기에 매번 비슷한 수준의 비슷비슷한 자료들만 축적된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태도로는 여론조사 동향에서 충분히 관측될 수 있었던 현상조차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지각된다. 이변이 속출하고 그것이 지나치면 또 다시 일상이 된다. 한국 사회가 변혁이 많고 짜릿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례가 기억되지 않고 매번의 사건이 해석되지 않은 채 빠르게 지나치기만 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다만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다.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조심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을 나눌 수 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그러한 태도이기도 하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다. 해일이 몰아치기 전에 제방을 쌓는 심정으로 우리 시대 저널리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한윤형 편집인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